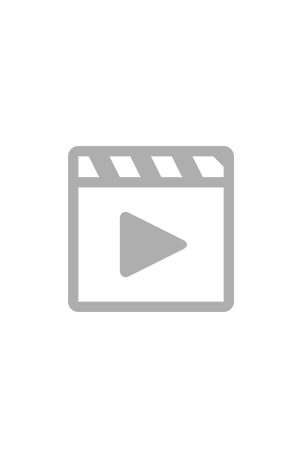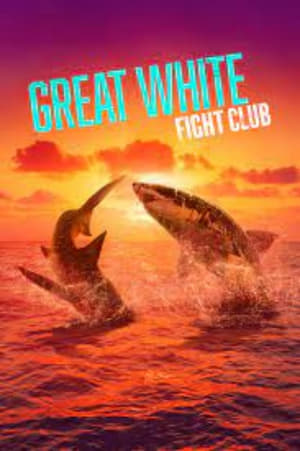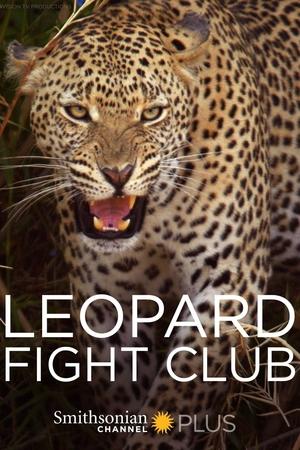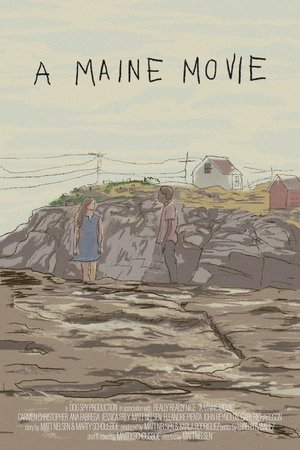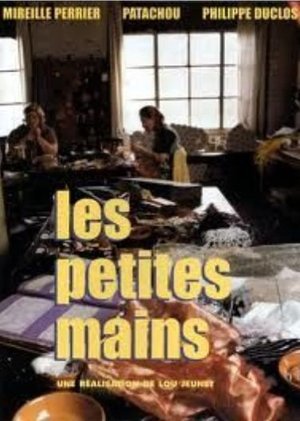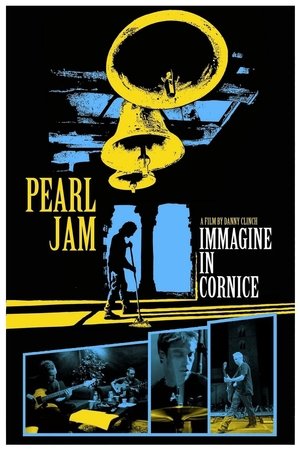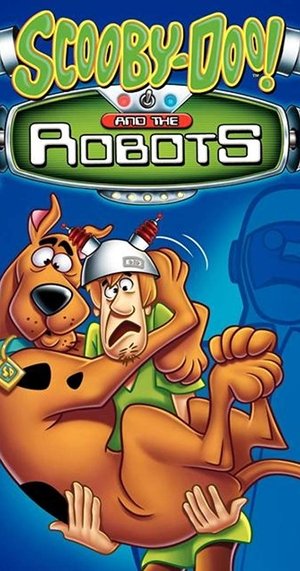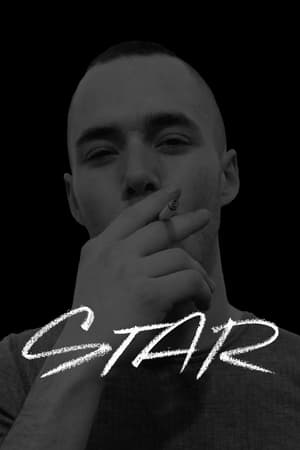태양의 도시 2017
조지아의 남부에 위치한 도시 치아투라는 한때 전세계 50%에 달하는 망간을 생산하는 탄광 마을이었지만, 이제는 쇠락한 유령 도시이다. 음악선생은 어떻게든 마을을 살려보고자 새로운 공연 준비를 하고, 광산에서 일하는 사내는 연기를 하고 싶지만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. 두 소녀는 계속해서 황폐한 마을을 달린다. 유령같은 마을의 정교하고 섬세한 풍경이 펼쳐진다. (2017년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) 리뷰 의 이 마을은 지구상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곳일까.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고 영화는 생각하는 것 같다. 조지아의 서쪽 지역에 위치해 있고 오래전 한때는 광산업의 영향력 있는 산업지구였지만 현재는 거의 폐광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이는 치아투라에서 촬영되었다는 사실은 그저 사실일 뿐 이 영화의 핵심은 아니다. 에는 앞선 사실보다는 그 사실로 인해 유발된 사실 이후의 시간 혹은 사실 이후의 분위기 그러니까 기울고 쇠퇴한 그 결과 찾아들게 된 유령적 상태가 핵심이다. 그러므로 이 마을은 지구상 어디에라도 있을 법한 쇠퇴와 몰락의 그 마을들을 연상시키는 추상적 모델로도 비친다. 몇 사람이 등장한다. 광산의 소수 노동자들, 동네의 아주머니들과 아이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음악선생, 홀로 벽을 부수는 남자, 달리기 훈련하는 두 명의 선수들. 마을에는 그들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영화는 오로지 그들로서만 이 마을을 그린다. 창공에서 시작된 어느 시선은 이내 지하 갱도의 인부들 사이로 들어가더니 마을을 느리게 돌아다니며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의 표정을 관조한다. 마치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견자의 시선이라도 있는 것 같다. 이 견자의 시선에 황폐함, 적요함, 쓸쓸함, 그러나 아직까지는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는 정겨움과 소박함이라는 마을의 분위기가 포착된다. 영화의 제목은 토마스 캄파넬라의 유토피아에 관한 동명의 책에서 가져왔으니, 역설적이다. (2017년 제9회 DMZ국제다큐영화제/정한석)
- 출시 됨: 2017-02-10
- 실행 시간: 104 의사록
- 유형: 다큐멘터리
- 별:
- 감독: Arseni Khachaturan, Rati Oneli, Dea Kulumbegashvili, Rati Oneli